|
夢幻空華를 何勞把捉가 得失是非를 一時放却하라 몽환이요 공화인 것을 무어라 애써 붙들려 하는가 얻고, 잃고, 옳고 그름을 한꺼번에 놓아버려라 - 신심명信心銘 안녕하십니까. 치문반 동진입니다. 여기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물위에 내가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사위는 고요하고, 햇살은 따스하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갑자기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이 한 생각에, 이제까지의 고요와 평화는 숨 막히는 공포로 뒤바뀝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꿈입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극락도 지옥이요 한 생각 돌이키면 지옥도 극락입니다. 이 한 생각 옮기는 게 쉽지 않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시비비에 시달립니다. 어찌 보면 산다는 건, 그 자체가 시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도 질다, 되다, 설었다, 조가 들었구나, 콩이 들었구나, 식은 밥이다, 더운밥이다……. 한 그릇의 밥을 다 먹어도 한 술의 밥도 먹은 바 없고, 천 리를 걸어도 단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 없이' 그렇게 살날은 요원한 것일까요?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얘길 잠시 할까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유머가 넘치는 분이셨는데, 그 분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 남이사,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 저 어릴 때는 어쩐 일인지 주변에 전봇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 전봇대를 보면서 ‘저걸로 이를 쑤시는 걸 보면서도 참견 안하기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의 이 말이 지닌 좋은 점은 당신이 잘못해 놓고도, 남이 뭐라 하면 ‘참견 말라’는 식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 있었던 점입니다.
동네 아낙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남의 흉을 볼라치면, 우리 어머니 지나가다가 그 머리위에다 대고 어김없이 한 마디 하셨습니다. “남이사,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 말든 !” 어려서부터 그 말을 자주 듣고 자라서인지, 우리 가족은 남의 얘길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어하고, 웬만큼 이상하게 굴어서는 사람들과 절대로 시비하지 않는, 그런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이 점에 대해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전봇대로 이를 쑤시는 건 약과일 정도로, 더 이상한 사람도 많고, 못 봐 주겠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건, 그것도 한 공간에서 같이 산다는 건, 참기 어려운 걸 참아내야 할 일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길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참견하고 싶고, 분심을 냅니다.
전갈 얘기,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금방이라도 떠내려가게 생긴 전갈이, 돌 틈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중, 지나가는 개구리를 만나게 됩니다. 전갈은 개구리에게 제발 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건네주고 싶지만, 네가 분명히 나를 찌를 텐데 어떻게 그러겠냐고. 전갈은 절대로 찌르지 않겠다고, 생명을 구해 주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개구리는 전갈을 태우고 개울을 건넙니다. 개구리 등에 타고 개울을 건너던 전갈은, 그 말랑말랑한 등을 찌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끝내 독침으로 찌르고 맙니다. 결국, 둘 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개구리가 말합니다. 바보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전갈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어쩌겠니, 내가 전갈인데.
전갈의 경우처럼, 설사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걸 뜯어고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고치려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상대방을 못 봐주는 것은 ‘나와 다른데’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마 싫어한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상대방이 콩 골라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주기 싫습니다. 나는 빠른데 상대방 느린 것,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 말 많은 것, 큰 것, 작은 것, 잘난 것, 못난 것······. 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 상대방이 내 몸이라도 그럴까요?
바다는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고, 비는 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구름이 됩니다. 바다, 구름, 비가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이고, 그 공통성은 습기(濕氣)하나입니다. 습기,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동진, 동찬, 동은, 동현 등의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바다와 구름과 비처럼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것은 내가 구름이면서 바다나 비가 없으면 좋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없습니다. 이를테면 내 손가락하나가 썩고 못나서 꼴 보기 싫습니다. 그걸 잘라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미노 게임을 아실 겁니다. 한 조각의 도미노가 움직임으로 해서, 온 세상이 좌르륵 열리지만 하나 어긋나면 그 속에 숨어있던 글씨도 그림도 그 장엄함도 다 사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태어남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짐이라. 한 조각의 구름으로 이 세상에 온 우리, 습기하나 버리지 못해 습기대로 삽니다.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이 허무한 구름 한 조각, 우리 하나로 뭉쳐 지혜의 단비가 되어서 이 고통의 바다에 법우(法雨)로 흠뻑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시비와 더위에지지 마시고 끝내 성불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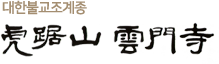
 인쇄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