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매달 낙동강을 순례하며 강의 변화를 기록할 예정인 지율 스님. 스님은 무엇보다 자연의 경고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
“우리가 크면 흙이 되어주자. 꽃을 심을 수 있게. 동물들이 땅을 밝을 수 있게. 꽃들이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도롱뇽이 내 안에서 건강했으면 좋겠다….”상주에서 만난 ‘천성산 도롱뇽’은 운문사 학인 스님들과 동요 ‘좋겠다’를 함께 부르고 있었다. 지율 스님. 스님은 지난 3월 6일 1300리길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연못 황지부터 강의 끝자락 몰운대까지를 한 달간 걸으며 더듬었다. 그리고 다시 순례에 나섰다. 이번엔 자전거다.
지율 스님이 자전거로 낙동강 순례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4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운문사 학인 스님 25명과 낙동강을 따라 걷고 있는 스님을 찾았다. 스님이 탁발하듯 낙동강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한 번 만나 스님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휴대전화도 없어 이메일로만 연락이 가능한 스님이다. 운문사 학인 스님들에게 강과 생명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2박 3일간 지율 스님의 순례에 동참한 강사 진광 스님과의 인연이 고마웠다.
지율 스님은 소매가 헤진 승복 주머니에 수첩을 담고 카메라를 어깨에 멘 채 낙동강을 따라 걸었다. 여차하면 카메라를 들고 수첩엔 뭔가를 열심히 적었다. 한참 강을 바라보며 걷다 물었다. 머물고 있던 경북 영덕 산골마을에서 내려와 강을 따라 걷는 이유가 궁금했다. 스님은 홈페이지 초록의 공명에 “당분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 3년 간 열어 두었던 산막의 문을 닫고 낙동강을 도보하며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고 밝혔었다.
한달간 강의 변화 사진- 수첩에 기록
“천성산을 보듯 낙동강을 봤어요. 그리고 ‘4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첫 삽을 뜬 안동을 지나왔지요. 그러나 아직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고 가슴 속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걸을 수밖에 없네요. 마음 속 갈등과 질문들을 안고 있기보단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스님은 우리의 욕심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생태계를 훼손해 수없이 많은 생물종들이 땅을 떠났다고 했다. 물과 공기는 오염됐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통이 두절됐고 산하의 원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운하도 4대강 정비도 결국 생명 젖줄인 물 문제였다.
 |
| 지율 스님은 주민들의 말을 꼼꼼히 받아적었다. |
천성산도 사실 지하수 문제였다고. 그래서 스님은 걷고 또 걸으며 관찰자로서 낙동강의 변화 하나 하나를 기록하려고 한다. 밭을 가는 할머니, 길을 지나는 주민, 이장님 등등. 슬쩍 낙동강의 변화를 묻는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적었다. 본다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며, 기록하는 일은 재능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모두 마음이 시킨 일이리라.
“물은 대지를 흐르는 피에요. 우리는 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잖아요. 낙동강도 정비든 운하든 개발이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해요. 백 발자국 걷고 사진 찍고 기록해요(웃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최소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낙동강이 변하는 모습이 슬픔을 가져다주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대지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대지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내 몸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야 한다. 스님은 둘이 아니란다. 강을 따라 걷고 강의 기운을 느끼며 주변의 생명들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강을, 운하와 4대강 정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왜 아름다운 이곳을 굴삭기로 후벼 파야 하느냐고. 운문사 학인 스님들은 낙동강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현실을 바로 보기 시작했다. 학인 스님들의 탄식이 잦아졌다.
“여기가 왜 이렇게 변해요?”, “저기도 나무들을 베고 제방을 쌓네요.”, “강이 아니라 모래사장만 보고 다니니 답답해요.” 스님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 가장자리인 둔치의 보상 문제를 다 끝냈다고 했다. 상주를 흐르는 낙동강 일대 둔치에도 노란 깃발이 늘어서 있었다. 측량을 끝냈다는 빨간 깃발도 노란 깃발을 따라 둔치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새삼 둔치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는 스님. 작은 숲도 있었고, 경북 칠곡 부근 낙동강 둔치에선 고라니도 모습을 드러냈다. 뭇생명들의 터전이었다. 지금 정부는 둔치를 말끔히 정비해 잔디를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스님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기자에게 한 마디 던졌다.“자연은 계속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선 북극곰이 사라지고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지구를 떠나고 있는데 말이죠. 더 급하게 더 무섭게 오기 전까지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
개발만 생각하는 우리 욕심 두려워
지율 스님은 매달 한 번씩 낙동강을 기록하고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강원도 태백을 출발해 안동-풍산-예천-상주-대구-창녕-밀양-양산을 거쳐 하류에 이르는 순례. 긴 순례가 될 것 같다. 문득 눈송이의 무게를 가늠해본다. 아주 작은 박새가 비둘기에게 물었습니다. “눈송이의 무게를 알고 있니?” 비둘기가 답했습니다.
 |
| 운문사 학인 스님들은 강가를 걸으며 자연과 자신의 관계를 돌이켰다. |
“눈송이의 무게라고? 눈송이에 무슨 무게가 있겠어. 허공처럼 전혀 무게가 없겠지.” 그러자 박새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눈 내리는 전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 할 일도 없고 해서 막 내리기 시작한 눈송이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 가지 위에 쌓이는 눈송이는 정확히 374만 1952개가 내렸어. 그런데 말이야.” 박새의 잔잔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눈송이 하나가 374만 1953번째 눈송이 하나가 가지 위에 내려앉자, 가지는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지. 무게가 전혀 없는 허공과 같은 눈송이 하나가 앉았을 때.”
단 한 사람의 마음이, 관심이, 행동이 부족한 건지도 모른다. 세상의 생명들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데는.
상주=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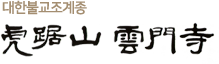
 인쇄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