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은 우선 날씨가 화창해서 좋기도 하지만,
바깥에서의 활동도 많고 챙겨야할 기념일도 많으니만치 분주한 달이기도 하다.
오월의 여러 기념일 중에서 군인들이 설친 날들만 빼면
모두가 이 날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새기고 감사해야할 뜻 깊은 날들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별스런 요직에 있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도 덩달아 마음이 바빠져
뉴스는커녕 꼭 챙겨 보리라던 <불교신문>도 건성건성 볼 따름인데,
오월 어느 날 배달된 불교신문의 한 모퉁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그래,
당좌에 앉은
한 쌍의 풀무치다
당목이 아찔하게 밀려오고 있는데도 머언 산 단풍을 보며 흘레붙은
저 풀무치.
이걸 보고는 ‘참 멋진 시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감탄한 것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바로 저 당좌撞座(한국 범종의 종을 때리는 부분, 흔히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를
더엉덩 치는 통나무를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 당목撞木이란 전문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작품에 아로새긴
그 시인의 전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의 일이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더는 되새김 않고 사무실 한쪽에 신문을 고이 접어놓았는데,
아는 선배가 어느 날 들렀다가 바쁜 척하는 꼴에 밸이 꼴렸든지
아니면 무료한 지 신문더미를 헤치다가 불쑥 물었다.
“이 시조 참 좋제?”
“어! 그거 현대시가 아니라 시조였어요?”
“그런데 시도 좋지만 제목이 쥑인다.”
“제목이 뭐길래...”
“근황이라네, 근황.”
“정말이요?”
비로소 그 시조뿐만 아니라 작가와 제목과
그 밑의 홍성란 시조시인의 작품평까지 읽게 되었다.
이 시조를 지은 이는 이종문 시인이었고, 시평詩評은 이랬다.
당랑재후란,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는 뒤에서 자기를 노리는
황작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의미다.
눈앞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장차 닥쳐올 큰 재앙(죽음)을 모르고 사는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것이다. ‘
근황은 한 쌍 풀무치를 통해 중생들의 삶의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좌는 종 망치가 닿는 자리다.
사마귀가 황작을 의식하지 못 하듯 언제 몸 부서뜨릴
망치가 들이닥칠 줄 모르고 사는 건 풀무치만이 아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 모두의 근황을 이 시조는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생들이여, 중생들이여. 부처님께서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음을 깨달으라 하셨다.”
시인은 낮은 목소리, 담채화 같은 시조로 설법하고 있다.
홍성란 시조시인 [불교신문 2325호/ 5월9일자]
야구 용어로 하자면 ‘참 잘 치고, 잘 받았다.’
도대체 나이가 나보다도 한 살이나 어린 사람이 지은 시도 짜증나게 놀랍지만,
그 짧은 시의 속내를 모두 읽고서 도도히 풀어헤치는
내 여동생과 동갑의 평자評者도 보통 고수가 아니다.
받고 주는 거래가 상식을 넘었다.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자괴감이 아득하게 몰려오는데,
심통이 난 나는 이전에 봤던 다른 글을 또한 기억하려 애썼지만,
마릴린 먼로에 버금가는 백치미白痴美의 나는 대강의 줄거리만이 생각날 뿐이다.
내가 시원찮아 어느 날 할아버지께 불려갔다.
할아버지는 “너는 어째 맨날 그래샀냐. 저 징게맹게(김제, 만경평야) 명문가 도령은
종이에다 글을 쓰고 또 쓰고, 다시 그 위에 글을 덧써 필경에는 그 종이가 까망종이가 됐다는디...”
감히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물러나온 나는 밤하늘 달을 보며 괜히 씨부렁거렸다. “
그 양반댁 도령이란 놈. (먹물종이로) 뒤를 닦았으니 똥구멍이 새까맣겠다.”
초파일이 지나자 잠시 여유로운 분위기에
다시 이 시조가 보고 싶어 신문더미를 뒤지니,
아뿔싸 선배가 어느새 그 부분만 얌전히 오려간 것이 아닌가?
참 없는 것 같아도 고수는 도처에 있나보다.
하는 수 없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근황’이란 이름의 또 다른 시가 있었다.
신문 조각이 없어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일까.
나는 고수가 결코 아니지만 작가의 유명세에 비해
이 시는 나에게 감동이 조금 덜 할뿐만 아니라,
무위를 노래하지만 여기서는 작위의 냄새를 맡으니,
나도 고수 축에 진입할 날이 올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몇 생애나 후에.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한가.
이번 휴일에는 성주사 설법전 외벽에 그려진 안수정등岸樹井藤
벽화 그림을 다시 곰곰이 봐야겠다.
원숭이는 붉은 꽃잎으로 뒤처리해서 빨간 것일까?
화급火急에 엉덩이를 덴 것일까.
근황 / 황지우
한 이레 죽어라 아프고 나니
내 몸이 한 일흔 살아 버린 것 같다
온몸이 텅텅 비어 있다
따뜻한 툇마루에 쭈그려 앉아 마당을 본다
아내가 한 평 남짓 꽃밭에 뿌려 둔 어린 깨꽃 풀잎새가
시궁창 곁에 잘못 떨어져, 무위로, 생생하게 흔들린다
왜 저런 게 내 눈에 비쳤을까
나은 몸으로 다시 대하니 이렇게 다행하고
비로소 세상의 배후가 보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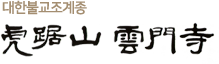
 인쇄
인쇄


